*이 글에는 영화의 결말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본다는 것이 권투 선수가 링에 오르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 상대편 선수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이 무작정
링에 올라서 시합해야 하는 느낌. 어떨 때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경기를 끝내지만, 때론 상대방의 강타에 휘청거리다 링을 나오는
때도 있다. 나에게 미카엘 하네케(Michael Haneke) 감독은 선수로 치자면 상대편을 무척 진이 빠지고 힘들게 만드는 무척
까다로운 대전 상대다. '피아니스트(The Piano Teacher, 2001)', 히든(Hidden, Caché, 2005)을
보면서 그 암울하고 출구 없는 세계관이 참 싫었더랬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양반 영화는 그냥 안보고 피하게 되었다. 그러다
오늘은, 그동안 좀 쉬운 선수들을 만났으니 약간은 좀 긴장 좀 해보자 싶었다. '우연의 연대기에 관한 71개의
단편(Fragments of a Chronology of Chance, 1994)'을 그렇게 영화 감상의 링 위에서 만났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로버트 알트만의 '숏 컷(Short Cuts, 1993)'과 구스 반 산트의 '엘리펀트(Elephant,
2003)'가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다. 솔직히 '어, 좀 약한데?'라고 슬쩍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하네케만의 디스토피아적 관점은 관객을 진흙탕으로 무작정 끌고 들어간다. 영화는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방송 뉴스 화면이 흘러 나온다. 뉴스들의 내용은 당시 분쟁 지역들과 관련된
소식이다. 보스니아와 소말리아, 아이티의 내전 소식, IRA와 쿠르드 반군의 전투, 유럽의 이민자들 문제며 유고슬라비아의 인종
청소,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 소식까지 망라한다. 전혀 관련이 없는 이들의 일상은 암전(blackout)화면에 이어
연결된다.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은 루마니아 소년, 고아원 아이를 입양하려는 중년의 부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보안회사 직원과
그 아내, 가족의 무관심 속에 홀로 지내는 외로운 노인, 불만이 가득한 대학생이 각각의 에피소드를 끌어간다.
1993년 10월에서 12월에 이르는 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빈을 배경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은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에
은행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엮인다. 1시간 35분의 러닝타임에 마지막 15분 가량의 결정적 순간을 향해 가기까지 영화는 더디고
지루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시간이 정말로 느리게 간다고 느끼게 된다. 관객은 외롭고 아픈 노인이 냉담한
딸에게 쏟아내는 폭풍같은 불평의 전화와, 대학생이 탁구 연습을 하는 롱테이크를 명상하듯 응시해야만 한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라고 계속 질문을 던질 때마다 뉴스 보도 화면이 딱딱 맞춰 나온다. 전쟁과 참혹한
살상의 소식은 고립된 인물들의 일상과 병치된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다. 노인이
딸(은행원)을 만나는 곳은 자신의 연금을 찾는 은행 창구이며,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한 부부는 가벼운 대화나 접촉도 거부하는
아이의 폐쇄성에 좌절한다. 국경을 넘은 소년은 도둑질과 거리 생활에 익숙해지며 부랑아가 된다. 거리를 헤매는 이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 영화에는 하네케의 주요 관심사인 미디어, 인간 사이의 소외와 단절, 폭력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 있다.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뉴스 화면은 매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보는 이들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소식들에 무감각해진다. 그 누구도 화면 속에서 재현되는 폭력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없다. 미디어는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단절시키고 고립시킨다. 전화통을 붙들고 딸의 무관심을 꾸짖는 외로운 노인의
옆에는 TV가 켜져있고 계속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조용히 통화하려면 TV를 꺼야하지 않을까? 이 노인은 밥 먹을 때도 TV를
켜놓는다(사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한다). 노인에게 미디어는 세상과의 소통이 아닌, 아무 의미 없는 배경 소음으로 존재한다.
영화 속에서 눈길을 끄는 흥미있는 장면이 있다. 바로 대학생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조각 퍼즐 놀이이다. 잘라진 종이 조각을
맞추어 하나의 형태로 완성하는 것인데, 그들은 퍼즐을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결국 그 퍼즐을 완성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영화는 조각난 이야기들을 '우연'이라는 요소로 그러모아 마침내 하나의 장면으로 완성한다.
고장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내지 못한 대학생은 갑자기 총을 들고 은행에 들어가 난사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실제
있었던 그 사건에서 범인의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하네케는 그 사건을 이 영화의 마지막으로 선택했다. 희생자가 된 이들이 무심히
보았던 뉴스는 다시 그들의 비극을 방송으로 송출한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 폭력은 일상에 스며들어 빠르게 재생산된다.
하네케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차갑고 건조하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존재이며, 고립과 단절은
인간의 숙명이다. 미디어가 그런 인간을 이어주고 더 나은 곳으로 안내해줄 거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쏟아내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들은 사태를 제대로 성찰할 이성을 마비시켜 버린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미 방송되었던 뉴스가 똑같이
반복되어서 재생되는 장면은 그 악순환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네케 영감님의 암울한 닫힌 세계가 궁금한 이들은 한 번 감상해 보기 바란다.
*사진 출처: criterionchann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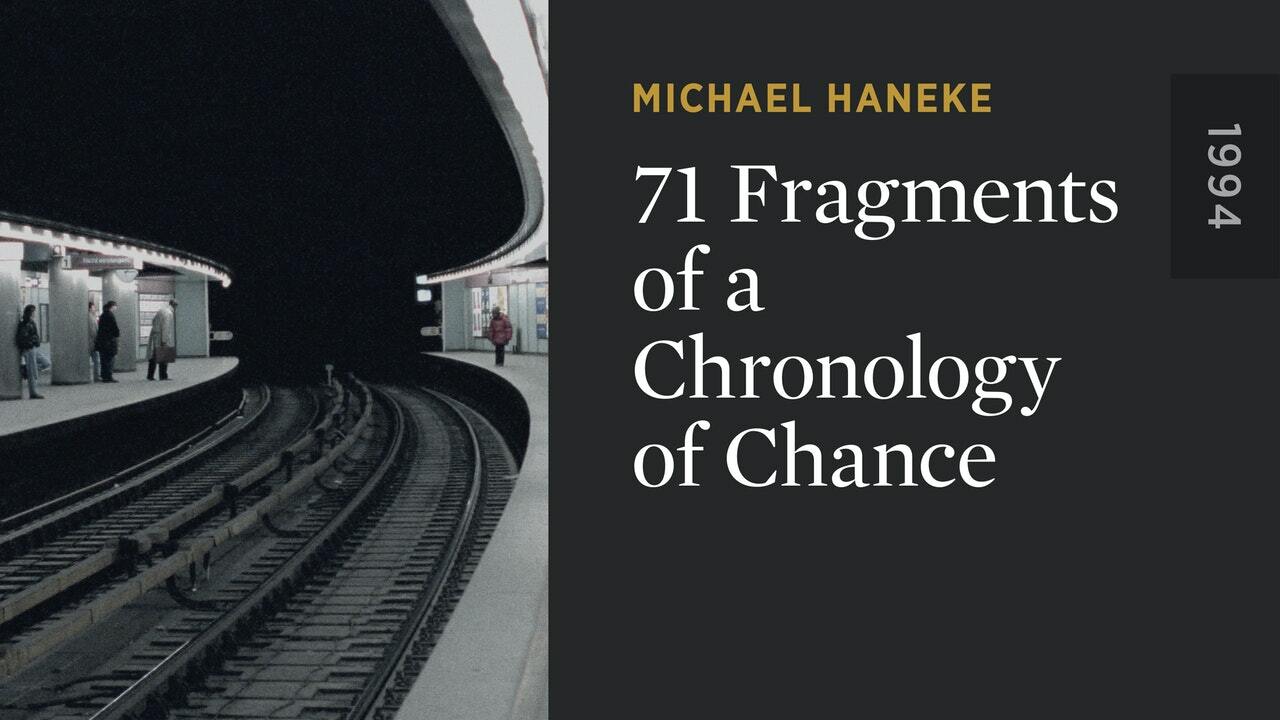
댓글
댓글 쓰기